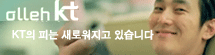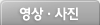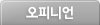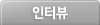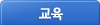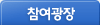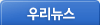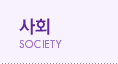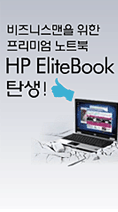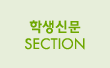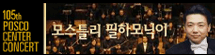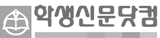요즘의 국립천문대 격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전문 부서로 관상감(觀象監)이 있다.
주요 업무가 역법의 계산과 역서 간행, 일·월식의 예보와 구식례(求食禮·일식이 있을 때 지내는 제례), 물시계의 관리와 시보, 명당의 선정, 중요 행사를 치를 길일(吉日)의 택일 등으로 관상감은 조선시대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 비해서 자리와 돈은 늘 부족하다고 했던가. 관상감도 마찬가지여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자리는 겨우 30여개에 불과했지만 관상감의 관원은 19세기말 당시 180명 정도였다.
요즘 같으면 철밥통의 정규직 30개에 나머진 모두 헐값으로 봉사하는 파리 목숨의 비정규직으로 채웠을 것이다. 그나마 비정규직은 해마다 말 잘 듣는 충성심 강한 관원으로 갈아치웠을 것이다. 그런데 관상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관상감에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30여개의 자리는 철저하게 보직의 개념이었다. 행정 업무를 보는 자리들(정, 첨정, 판관 등의 체아직)은 임기가 6개월에 불과했으며, 관상감의 내부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자리들(교수와 훈도 등의 실녹관직)은 30개월 또는 45개월의 임기를 두고 관원들이 돌려가면서 맡는 관직이었다.
전체 관원 180명에게 이 관직은 공평하게 열려있었다. 철저하게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으로 선발했으며, 연임은 불가능했다.
녹봉을 받는 30여명 이외의 나머지 관원들은 일종의 프로젝트 단위로 그룹이 나누어졌다. 예컨대 삼력관, 수술관, 추보관 등이 그들로 업무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서 그룹간 지위에 차이가 났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프로젝트에 차출되면서 일정액의 프로젝트 인건비인 산료를 받았다. 이들 외에도 총민과 별선관, 그리고 전함으로 불리는 예비 인력군이 있었는데 이들도 특별한 업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일정액의 산료를 받으며, 일상적인 관측활동 등을 입직을 서면서 수행했다.
이와 같은 관상감의 직제와 조직 운영에서 불공평한 차별이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녹봉을 받는 관직 자리는 철밥통이 아니었으며, 누구에게나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에 따라서 열려있는 임시적인 자리였다.
프로젝트 단위로 나뉘었던 삼력관 등의 그룹도 비록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위의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근무연한과 능력에 따라 더 좋은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얼마전 ‘전국과학기술노조’에서 대덕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에 필자는 깜짝 놀랐다. 그들의 평균임금이 1백28만원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2백12만원)의 60%에 못미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 중에 40%는 4대 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대덕단지 연구원 중에 50%를 넘는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해 과학기술위성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려 우리의 자존심을 한껏 올려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위성연구센터의 해당 연구팀 26명 중 비정규직이 23명이었다는 사실은 기쁨과 함께 비통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이유 없는 차별을 받는 현재의 비정규직 과학기술자들에게 조선시대의 관상감은 천국이 아닐까.
어느 것이 중세적이고 어느 것이 근대적인 것인지 헷갈린다.